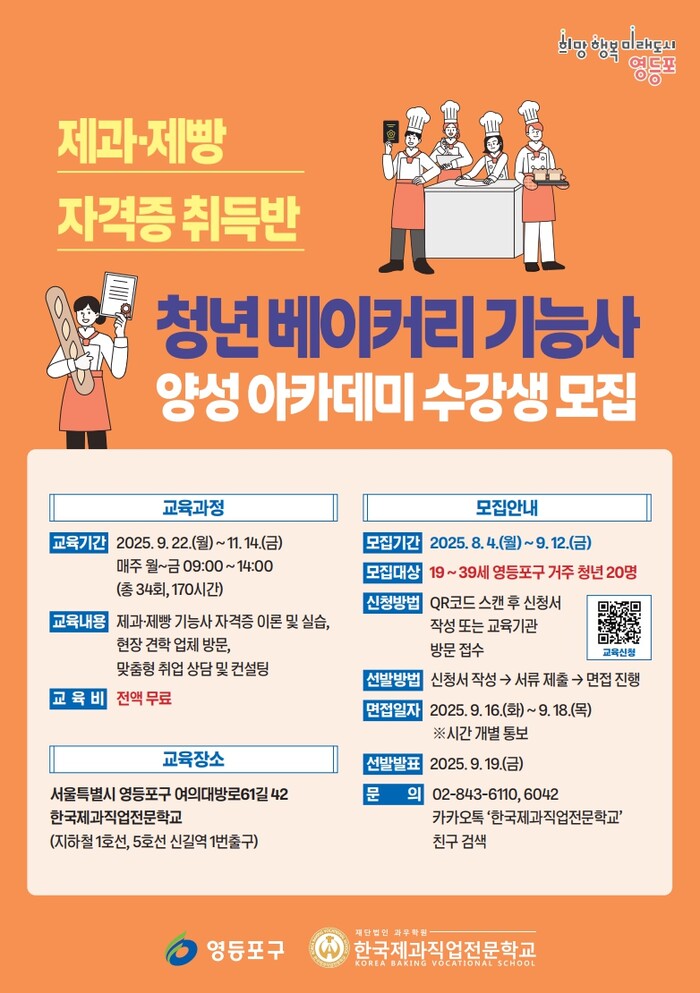[공감뉴스=현예린 기자] 최근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제때 구호조치되지 못해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두 번째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정폭력 행위자가 집안에서 문을 걸어잠그고 인기척을 내지 않아 경찰이 별다른 조치 없이 되돌아왔다 세 번째 방문에서 피해자 구호조치 했지만 중태에 빠졌다.
이처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 상 가정폭력 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적이지 않을 때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관련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
| ▲ |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30.2%가 출동한 경찰을 만날 수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피해자 14.0%는 배우자의 협박에 의해 경찰에 구호요청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경찰을 돌려보냈다고 답했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가정폭력 구호요청 대응의 예견된 한계-가정폭력 현장 조치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폭력방지법 제22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관련 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 가해자의 거부로 현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찰대응 규정이 정비돼 있다. 캐나다는 911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긴급상황이라는 경찰의 판단에 의해 경찰은 주거지에 강제진입할 수 있다. 미국 판례는 신고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현관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을 때를 긴급상황으로 판단하여 주거지에 진입한 경찰관의 결정을 합리적이라 판시한 바 있다.
 |
| ▲ |
보고서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별도 조항을 마련, 경찰관에게 가정폭력 현장 확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집안 내부에서 가정폭력 신고전화가 걸려온 경우, 집안 내부에 있는 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긴급상황이라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 등에는 현장 확인을 위해 주거지에 강제 진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1차 신고 시 경찰관이 가해자의 위험성을 판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임시조치를 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는 점도 재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The)공감뉴스 현예린 기자(hyseong123@nate.com)
[저작권자ⓒ 더(The)공감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