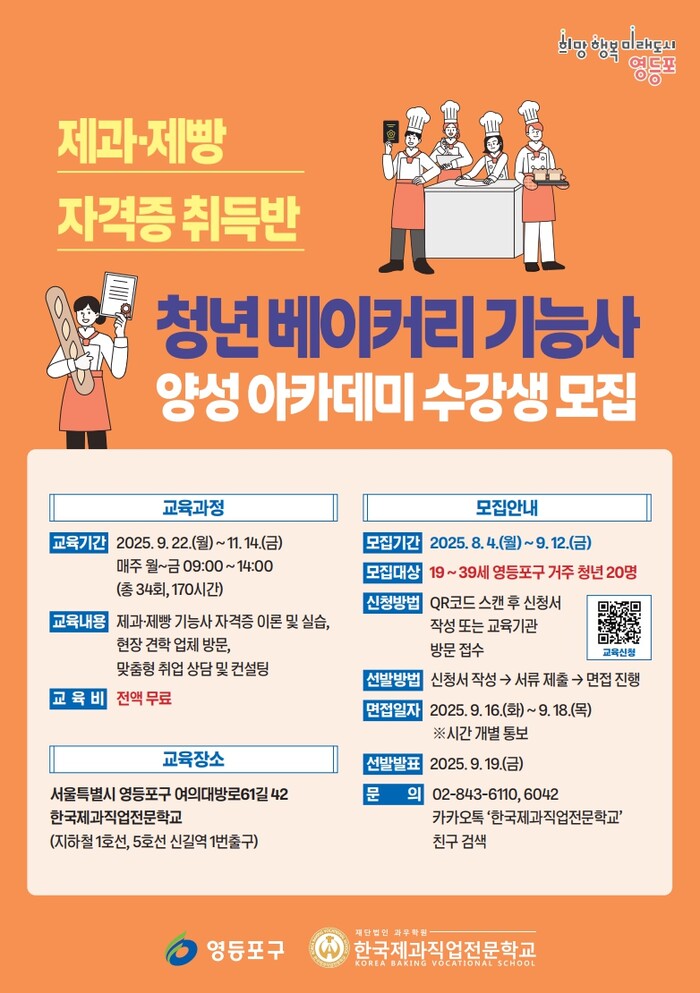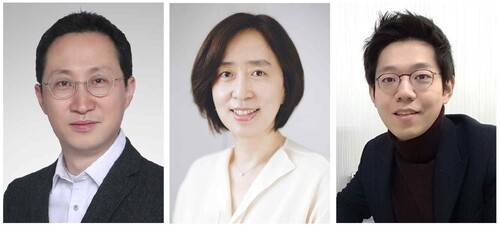 |
(왼쪽부터) 조정호 연세대 교수, 정소희 성균관대 교수, 문홍철 서울시립대 교수 /사진제공=연세대 |
이번 연구는 광 반응성을 지닌 인공지능 반도체 소자를 사용해 인간의 자극-반응 시스템을 모사한 연구로, 다양한 빛의 강도에 따라 유기적으로 반응하는 생체 모방 보형물의 개발 가능성을 열었다.
인간은 수십 개의 정교한 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수십 년 동안 보철 분야는 노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손상된 생체 장기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 보철 중 외부 자극을 인지할 수 있는 보철 구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인공 안구는 인간이 외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 80%를 사용하는 시각을 모사한다는 점에서 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인공 안구와 관련된 연구들은 빛에 대한 높은 인식률을 달성했지만, 생체 안구처럼 자극-반응 과정을 통해 수용하는 빛의 세기를 조절하는 인공 안구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다.
동공 반사와 순목 반사는 사람의 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자극-반응 중 빛의 수용과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반응이다.
동공 반사는 망막에 도달하는 빛의 강도에 따라 동공의 직경을 조절해 빛의 강도를 조절하며, 순목 반사는 강한 빛이 들어왔을 때 각막을 보호하기 위해 눈을 깜빡인다.
이 두 가지 반사를 통해 사람은 수용할 수 있는 빛의 세기에서 적절한 양의 빛을 망막에 도달하게 만들어 물체를 선명하게 인지할 수 있다.
연구진은 생물학적 눈꺼풀, 동공 및 시신경에 해당하는 부분을 솔레노이드 기반 인공 눈꺼풀, 전기 변색 소자 그리고 광 반응성 인공지능 반도체 소자(광 시냅스 소자) 기반 뉴런 회로로 대체해 수용되는 빛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인공 안구 시스템을 구현했다.
특히, 해당 보철 구현에 있어 빛 인지 및 신호 처리의 핵심 역할을 하는 광 시냅스 소자를 사면체 형상의 인화인듐(InP) 양자점을 산화물 반도체에 내장해 제작했다.
제작된 광 시냅스 소자의 경우 기존 산화물 반도체 기반 광 시냅스 소자에서 달성하기 힘든 장기 억압 특성을 양자점 도입을 통해 구현했다는 점에서 과학적 의의가 존재한다.
연세대 조정호 교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인지하는 기존의 인공 안구 연구에서 더 나아가, 빛을 인지할 뿐 아니라 외부 빛의 강도에 따라 유기적으로 반응하며 광 강도의 자율적 조절이 가능한 인공 안구를 제작한 연구"라며, "외부 자극을 인지할 수 있는 보철 구현에 있어 사람의 생체 반응 체제와 유사하게 구현했다는 점에서 향후 인공지능 반도체 소자 기반 보철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업단장 정소희 교수는 "해당 연구는 공유결합성 인공원자를 이용해 기존의 광 시냅스 소자가 지니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인공원자 소재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획기적인 연구"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11월 9일(현지 시간) 게재됐다.
더(The)공감뉴스 박태연 기자(gigi9047@naver.com)
[저작권자ⓒ 더(The)공감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